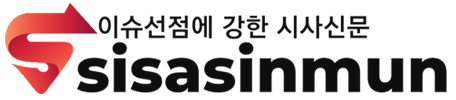지난 14일부터 전국 8개 극장에서 관람료 인상돼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매점과 광고수익도 높으면서 관람료까지 인상해야 되냐는 주장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극장 내 판매되는 팝콘 약 200g은 4500원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팝콘 200g은 600원으로 가격차가 약 7.5배였다. 그만큼 팝콘의 원가가 낮다는 얘기로 CGV가 매점판매로 얻는 실질 이익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광고량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CGV에 가보니 영화상영 예정시간 전후 10분씩이 광고에 할당됐다. 20분간 송출되는 광고 수를 따져볼 때 30초 기준이면 40편이 된다. 이 또한 CGV가 광고판매로 얻는 수익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실제로도 최근 CGV가 공개한 지난해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전년 대비 CGV의 매출은 6645억원으로 21.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727억원으로 88% 올랐다. 매출 중 매점판매는 1140억원, 티켓판매는 4400억원, 광고판매는 697억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27.2%, 24.2%,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CGV의 성적표는 매우 좋았던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로부터 더 거센 불만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 관람료 인상’과 관련해 CGV 측은 학생과 주부 계층이 주요관객인 극장 등에서 주중·주별 가격을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익 극대화 때문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격 인상이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극장과 시간대에 이뤄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더욱이 CGV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44.3%였다. 2009년 영화 관람료 가격인상 이후 매년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CGV의 고객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가격인상이 관객 이탈보다는 CGV의 이익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객석 점유율이 높지 않은 시간대에도 관객을 유입할 수 있어 그 이익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영화계에서는 CGV의 가격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영화배급사 측에 더 많은 수익이 분배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는 가격인상을 옹호하는 소비자들의 생각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7번방의 선물’, ‘베를린’ 등 한국영화가 선전하는 이때, 영화 관람료 인상이 CGV의 수익만 확대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